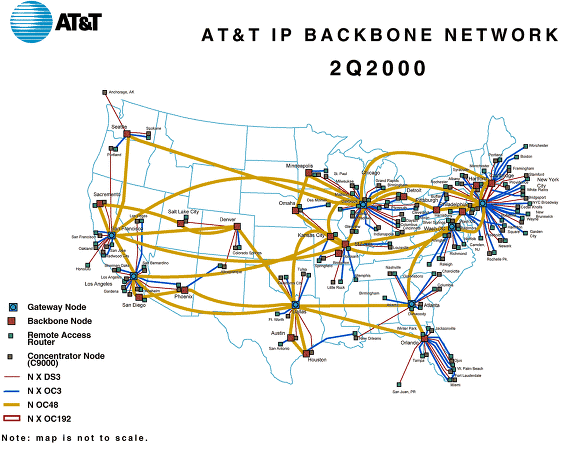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이성보다는 본능에 가까운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감각은 본능에 더 가까운 것이고 이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다. 그래서 '감각적인' 이란 말은 오히려 '본능적인' 뜻으로 사용되기 쉽고 감각은 주어진 능력처럼 생각하게 된다. 시각, 청각과 같이 외부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다양한 감각기관으로 생리학적인 능력으로 인식될 때가 많다. 그런데 감각이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보면 느낌 감 (感) 과 깨닫다 각 (覺) 으로 외부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깨닫는 작용까지 포함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인 오스틴 Jane Austen 의 소설 Sense and sensibility 를 그대로 센스앤 센서빌리티로 표기하기도 하지만 한국어 번역본의 제목은 「이성과 감성」 (김순영 옮김) 이다. 단순하게 sense 를 감각으로 번역했다면 아마도 소설의 내용을 떠나서 감각이 가지는 본능적인 느낌을 더 주게 되어서 소설의 내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타인을 자신처럼 생각할 수 있는 '공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감이 필요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공감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공감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면 여러가지 예를 들 뿐 공감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적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복잡해지고 자신의 영역은 명확해지고 공감의 필요성은 강조하지만 정작 사회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남기 위해서 타인보다는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타인보다는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역시 공감이란 어느정도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고 배워야 하는 그리고 노력해야 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막상 공감과 타인을 불쌍하게 혹은 긍휼하게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은 듣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오히려 세상은 정의와 진실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타인에게 더 엄격한 진실을 요구하고 그 진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쉽게 생각한다.
너무도 비슷한 말들이 혼재되어 사용되지만 조금이라도 그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본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감각이라는 말은 sense 로 사용되고 외부의 자극, 현상 등을 감지해서 알아내는 곧 깨닫는 과정이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후각,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미각의 소위 오감을 통해서 외부를 알아내고 그 감지한 (sensing) 정보를 뇌로 보내 뇌에서는 이를 처리하고 정보화하게 된다. 외부에서 전달된 신호 (signal) 를 뇌에서는 정보로 처리를 하고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한다. 모든 생명체가 감각을 가지는 일차적인 이유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빨리 알아내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차적인 이유는 과학의 목적과 동일할 것이다. 즉, 당장 위협의 요소는 아니지만 외부의 다양한 신호를 받아들이고 이를 체계화해서 일반화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연구 혹은 학문의 목적이다.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Alfred North Whitehead 가 교육의 목적에서 제시했던 낭만의 단계와 정밀화의 단계를 거쳐서 일반화의 단계를 가지게 된다. 이때 낭만의 단계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도 정밀화의 단계에서도 감각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래서 시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이들 더 구체적으로 태어나면서 아예 가져보지 못한 이들과 가지고 있다고 상실한 이들이 생각해보면 시각적인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는지 반대로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시각적 정보를 얻지 못하는지 생각할 수 있다.
마가렛 애트우드 Margaret Atwood 가 기술에 대해 했던 다음의 내용처럼
인간 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가지는 감각 그리고 그 감각을 통해서 빠르게 신호를 받아들여 정보를 만들어내고 싶은 인간의 노력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정의는 기술에 대한 성격을 더욱 정확하게 해준다. 안경이나 보청기 뿐만 아니라 현미경 망원경까지 인간이 가지는 감각을 확장해주고 일반적인 인간 능력으로는 얻어내기 힘든 영역 domains 까지도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인간 감각의 연장 혹은 확장이다. 감각은 본능에 가깝기 보다는 오히려 이성에 더 가까운 것이고 학문의 이유이기도 하다. 세상의 원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감각하려고 하는 과정은 인간의 가장 활동적인 연구 내용이기 때문이다. 감각이란 상당히 능동적인 활동이다. 외부의 자극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위협적인 신호라고 해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이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해도 무관심하다면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감각이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의 법칙같은 것이라기 보다는 세포가 에너지를 소모해서 세포 안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오는 능동수송 active transport 에 더 가깝다.
공감에 대해 이야기하면 공감을 영어로 무엇이라 표현하는지 부터 설명하는 이들이 많다. 영어로 sympathy 와 empathy 가 있고 이 둘의 차이는 sympathy 는 '동정하다/측은히 여기다' 라고 해석하고 empathy 는 '공감하다' 이고 마치 sympathy 보다는 empathy 를 가져야 하는 감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한때는 의사였다가 한때는 대선주자였던 누군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마치 사실처럼 되어버리고 마치 두가지 중 empathy 가 더 우위가 되어버렸고 하나의 편견처럼 되어버렸지만 sympathy 란 상대방의 상황 condition 이나 환경 circumstance 때문에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I am so sorry for your loss"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sympathy 의 예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공감한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때리고 나쁜 아버지였고 최근까지도 상대방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잘 안다고 해서 상대방의 속마음에 공감한다고 "이제 속시원하겠네" 라고 말한다면 괜찮을까 생각해 보자. 그래서 sympathy 를 동정하다/측은히 여기다 라고 골라 해석하지 않고 위로하다 연민을 느끼다라고 충분히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연민의 가치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해 본다. 누군가를 크게 공감하는 능력이 만드는 현상이 있다. 바로 자신을 납치한 이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비이성적인 현상을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 Stockholm syndrome 이 있다. 사회적인 법률을 떠나 자신을 납치한 이를 이해하고 크게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다면 단순히 동정과 공감으로 구별해서 empathy 의 능력을 강조한다면 스톡홀름 증후군을 가지는 인질은 공감 능력의 성자일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에서 우리가 비이성적인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사회라고 하는 공감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시대 (역사) 와 사회 (문화) 를 떠나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이 있을까 생각한다. 즉, 문명이 없던 원시 인류에게 죄라는 것이 존재했을까 궁금한 것이다. 생존이 목적이였던 그 때에도 모르긴 몰라도 자신과 같이 수렵을 하는 동료를 먹으면 안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일부 생명체는 자신과 유전적으로 비슷한 개체를 잡아먹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가끔 영장류에서도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같은 개체 사이에서도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잡아먹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없다. 단순하게 유물론 관점에서 바라보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 그냥 단백질과 지방 등으로 이루어진 아주 괜찮은 영양 공급원이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 고기를 먹는 경우는 극도의 불쾌함을 가지기도 한다. 물론 공감의 능력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처음부터 인류는 식인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존재하면서 인식하고 있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된다.
문화인류학을 통해 살펴보면 식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과정이기 전에 하나의 의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이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 파푸아뉴기아의 포어족은 장례 의식 중에 죽은 가족의 시체를 먹는 식인 문화가 있었다. 그들은 죽은이의 영혼과 같은 개념을 통해서 죽었지만 시체를 나누어 먹어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은 이의 시체를 먹는 인육 섭취의 과정은 불쾌한 과정이 아닌 당연히 마무리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영양학 혹은 감염의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런 식인 풍습은 상당히 나쁜 것이다. 우선 시체에서만 발생하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될 가능성도 높고 시체의 보관 상태를 고려해도 인육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이 포어족의 식인 풍습은 새로운 발견을 하도록 했다. 쿠루병이라고 운동장애를 시작으로 전신에 걸친 신경학적 마비 증상이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데 현재는 감염성 높은 뇌조직을 섭취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감염성 높은 단백질을 프라이온 Prion 이라 부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한참 논란이 일었던 광우병 - 소해면상뇌증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과 사람에 발생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CJD) 등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인간 뿐만 아니라 동종 혹은 유전적 유사성이 높은 동물들의 영양학적 섭취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모두 영양학적으로 모두 분해되어 자신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다시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지고 그 단백질을 만들어 내는 설계도가 유전자인데 이미 만들지도 않은 재료 중 완성품이 있을 때 어떤 질환이 일어날지 예상하기 힘든 것이다.
다시 넘어와서 식인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보아도 이제는 식인이 인간이 저지르는 나쁜 짓이라고 모두 공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모든 문화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관련된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느정도의 예외는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영화 하트 오브 더 씨 In the Heart of the Sea (2015) 나 얼라이브 Alive (1993) 과 같은 예가 있다. 그리고 현재도 국제법상으로는 식인은 중죄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죄를 묻지 않기도 한다. 살인의 경우도 비슷하다. 미국과 같이 광범위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국가(주)에서는 상대방을 죽이고도 기소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기소한다고 해도 실형을 살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때로는 살인에 의한 희생자보다 정당방위에 의한 희생자가 더 숫자가 많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서 정당한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런 정당방위는 암살을 하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이야기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정당방위의 범위가 너무도 협소하여 때로는 자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 남편이 막은 강도가 죽어도 남편을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정당방위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점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문화적인 가치보다도 오히려 법률적인 적용 내용이 더욱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느정도 정당방위에 의해서 행동해도 되는지는 형법이 정하는 범위가 어느정도인지가 중요하지 의도나 과정은 참고가 될 뿐이다. 그래서 정당방위가 상당히 넓게 인정되는 미국의 경우 총기 범죄가 많은 곳에서는 총기로 오인되는 물건을 가진 것만으로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정당방위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 가지는 죄책감이나 도덕적 감정은 나중의 문제이다.
우리가 가지는 감수성을 생각하게 된다. 감수성이란 영어로 sensibility 라고 해석하지만 이 느낌은 얼마나 감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마치 볼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가의 sense + ability 가 아닌가 싶어진다. 그래서 감수성이란 마치 타고난 능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처럼 해석되기 쉽지만 식인 혹은 살인이라는 주제를 통해 살펴봐도 모든 식인이나 살인조차도 죄를 묻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오히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죄인지 아닌지보다 인간의 행동 / 말이 가지는 사회적 감수성에 비추어 어느정도 용납이 가능한지 물어야 할 때가 더 많다. 그리고 결국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묻는 주체가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가 가지는 감수성의 정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종종 감수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개인의 능력 혹은 개인이 가져야 하는 덕목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사회의 결과물인 경우가 더 많다.
핸드폰을 쓰면서 감도가 떨어져 신호가 잘 잡혀 혹은 신호가 좋다 라는 표현을 할 때 기술적으로 자주 쓰는 단어가 감도 sensitivity 이다. 감도가 좋으면 외부의 작은 신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서 이를 감각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청각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외부의 소리 자극에 더 반응하기 쉽다. 반대로 그렇게 감도가 높은 이들은 그만큼 외부의 자극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그만큼 감도는 양면적인 측면이다. 감도를 높여서 감각을 하면 많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어 정보를 높일 수 있지만 쏟아지는 정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면 일상이 정보의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화재 경보기의 감도가 높아 자주 잘못된 경보를 울리게 되면 화재 경보기를 꺼놓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즉, 감도도 중요하지만 그 감각된 정보를 어떻게 잘 처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처리하는 정보처리 과정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감도 social sensitivity 를 생각해보아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다. 요즘에는 자주 거론되는 성감수성을 생각해보자. 성감수성이 낮았던 과거에는 성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할 때가 많았다. 대부분 성범죄의 피해자였던 여성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냐 혹은 합의를 보아서 다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성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조사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고문이 수사의 한 방법이라고 자랑하던 공권력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도 아니다. 아무리 강도가 높아도 성범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성감수성은 낮았을 것이고 그만큼 높은 성범죄의 피해자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커녕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가해자들이 그렇게 죄의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개인에게 돌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도가 낮기 때문에 즉, 성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꺼진 화재 경보기때문에 화재가 일어나도 대피하지 못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보는 것처럼 그 사회의 사회적 감수성이 없다면 결국 그 사회가 화재처럼 큰 충격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게 된다.
결국 사회적 감수성이 낮은 사회에서는 총체적인 문제가 터져 상당수의 피해자가 생기기 전까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리고 그런 감수성의 낮은 반응은 의외로 우리들 사이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무슨 일 있겠어?", "그게 뭐 어때서?" 혹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야?" 와 같은 반응들은 우리의 사회적 감수성을 낮추는 사회적 인식에서 나오는 표현들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오감(五感)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오감은 가장 기본적인 것일 뿐이고 새로운 기술에 따라 새로운 감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감각이 될 수 있고 인터넷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만들어 내지 않아도 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유용할 때가 많고 잘 사용하지 않는 이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어내는 것만을 생각해도 기술을 잘 이용하는 것도 인간의 새로운 감각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치 스타트렉 디스커버리 시리즈에 나오는 사루 Saru 와 같이 칼피언족은 자신의 대량살육을 감지할 수 있는 후두부에 있던 위험감지신경 (threat ganglia) 과 같이 다양한 종족들이 기술에 따라서 새로운 감각기관을 만들어 내는 세상같다. 그래서 아직 기술이 잘 적용되지 않거나 초기 도입 상태라면 그 기술을 통해 감각할 수 있는 이들이 적고 당연하게 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각할 수 있는 감수성도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지털 저작권이나 개인정보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소위 디지털 감수성은 기술의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 없고 예전에는 대기업조차도 개인정보를 모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그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악용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래서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고 있던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면 결국 그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해서 새로운 피해자들이 생기게 된다. 그때는 그리고 여전히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감수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나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는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보아도 결국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당연하 사회적 감수성이였다. 그런 시절에는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유출시켜 팔거나 악용하는 것이 그리 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낮은 디지털 감수성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심지어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제대로 된 비밀번호 관리를 하지 않는 (2차 인증이나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보안 감수성에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범죄에 쉽게 이용될 수 있는 문을 쉽게 열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쉽게 알려준 특정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통해 남자친구는 다른 서비스의 계정에 접속하고 이메일이나 대화내용 그리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비밀번호 공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낮은 감수성과 알려준 비밀번호인데 다른 곳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낮은 감수성으로 결국 예상할 수 없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감수성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바로 인터넷이다.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목적없이 공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에서 개인정보를 두가지로 구별했다. 우선 바로 알 수 있는 개인정보인 '본연적 개인정보' material privacy 이라 설명했고 바로 개인정보를 알 수 없지만 유추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는 '가공된 개인정보' manufactured privacy 으로 구별했다.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겠지만 아파트단지 사진이나 주변의 간판 등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개인정보이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올린 아이(들) 사진을 올릴 수 있지만 나쁜 마음을 먹는 납치범의 좋은 목표물이 될 수도 있다. 메신저나 닫힌 공간에서 자신의 성범죄 등을 대화하고 공유하는 이들도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낮은 감수성이 만드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상에는 닫힌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인터넷은 더욱 그렇다. 낮은 성감수성을 가지고 인격의 수준을 의심할 수 있는 이들의 대화 내용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감수성이 그정도인데 조금 닫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가 가지는 감수성은 사회 안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규칙을 통해서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할 수 있다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결국 법률에 의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법률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음란물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잘 인지한다면 그런 행동은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혹은 그런 법률이 있어도 나는 피해갈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이들에게는 그런 법률은 어떠한 장벽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적 감수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가지는 감수성이 낮게 된다. 종종 볼 수 있는 기득권자들의 갑질 논란도 결국 자신이 법률적 테두리를 벗어나 즉 사회적 감수성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감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감수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률 혹은 사회가 가지는 규법과 동일하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감수성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은 결국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든다. 갑질을 해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권력이 가지는 그 불공평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갑질의 피해자는 항상 존재한다. 누군가는 힘들고 고통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법률과 규칙은 누군가 불편은 받을 수 있지만 최소한 그 피해로 고통받는 이는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감수성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자신이 만든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고통마저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런 이유로 법률과 규칙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만들 때 불필요하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 낸다. 머리로 만든 법률은 결국 인간을 비현실적인 현실에서 살게 만든다. 그래서 법률은 오히려 인간의 고통에 관심가져야 한다.
소아 당뇨를 가진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 한국에서 소아 당뇨를 가진 아이들은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이 많다. 주사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고 급식시간은 쉽게 같이 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겉으로는 아무런 특별한 점이 없는데 소아 당뇨라는 말만 듣고는 설탕을 억지로 먹이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들의 그 잔인성은 어디에서 배운 것일까 생각하게 된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이라 생각하기에는 인간본성에 대한 배신감이 들고 주변에서 학습했다고 하면 그걸 학습하게 한 사회가 원망스럽기 때문이다. 인간본성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결국 학습한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같은 소아 당뇨 아이들이지만 미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에서 대하는 태도를 보고 나서였다. 주변 아이들도 소아 당뇨 아이들이 그저 눈이 안 좋아 안경쓰는 것처럼 음식을 조심해야 하고 필요하면 인슐린 주사도 맞아야 한다는 것이라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병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잘 인식하고 같이 어울리고 필요하다면 좀 더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한다. 같은 질환이지만 나라에 따라 인식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 인간 본연의 본성이 아닌 사회에 어떤 감수성을 제시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게 제시한 감수성은 결국 사회가 가지는 예의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예의란 결국 타인에게 함부로 상처주지 않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소아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이들은 예의없는 어른들에게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 "단거 많이 먹었지?" "도대체 몸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그런 병에 걸려?" 라는 질문을 주변에서 특히 어른들 그리고 그 어른들에서도 자신의 가족들에게서 듣는다고 한다. 예의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예의란 나이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얼마나 배웠는지의 문제이다. 그래서 단거 많이 먹어 소아 당뇨 걸린 것 아니냐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자신의 무식함으로 타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지 모르는 무지와 무례일 뿐이다. 아직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만들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은 결국 자신에 대한 질책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는 상처를 가지게 된다.
항암치료를 마치고 학교에 복학했을 때였다. 복학했기 때문에 나이 한살 어린 친구들과 공부해야 했고 모두 키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난 마지막 번호를 받았다. 키도 작은데 항암치료로 살은 찌고 머리카락은 거의 없는 소위 볼품없는 모습이였지만 내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국어 시간이였다. 선생님은 질문을 했고 내 번호에 내가 대답을 하니 질문은 멈추고 "이반은 몸무게 순으로 번호 매겼어?" 라고 뜬금없이 말했다. 반 전체는 그 농담에 모두 웃었지만 난 웃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서러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웃자고 한 농담이 나에게는 아직도 가끔 꿈에서 나타난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잊어버릴 수 있었겠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그것도 항암치료로 겨우 이겨낸 그 순간에 받아들이기에는 날카로운 상처였다. 그래서 그런지 꿈에서 악몽에 그 국어 선생님이 나올 때가 있다.
결국 인간에 대한 감수성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흑인이라 차별하거나 성소수자여서 싫다고 생각하고 말할 때 그 말이 인간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성소수자니깐 싫다는 이유로 혐오를 하고 차별을 한다면 결국 성소수자는 죽어도 된다는 끔찍한 역감수성 negative sensibility 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부터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역사와 의학으로 살펴보아도 그들의 탓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으로 차별하는 것은 예의없는 행동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감수성이란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 예의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예의를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이 규칙이고 법률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상처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가 주는 상처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만든 원칙이 있다. 결정할 수 없는 내용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별하고 결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유를 대어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 앞서 말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불쾌함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으로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그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혈액형을 가지고 B형이니깐 어느 지방 출신이니깐 심지어는 남자이기 때문에 ... 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거나 그 편견으로 다음 논리를 이어갈 때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준다.
누군가 좋은 감정으로 만나려 하는데 남자 여자 나이차이가 많았다. 좋은 만남을 시작할 때 여자 부모님들은 남자를 만나서 이것저것 묻기 시작한다. 결혼 상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 궁금한 것이 많을 수 있지만 우선은 나이가 많은 것부터 신경쓰이기 시작하셨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나이 많은 것으로 이어진 걱정은 바로 '결혼한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동거한 적은 없었는지' 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을 요구했다. 물론 그러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존재했다. 나이는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나이로 인해서 결혼한 적이 없는지 묻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한적은 없는지 그리고 동거한 적은 없는지를 묻는 질문들은 무엇을 걱정하는 것인지 듣는 이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같은 질문을 누군가 자신의 딸에게 했다면 그 기분이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역지사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질문들이 상대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던진 질문인지 고민은 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은 이성적인 질문보다는 두려움에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질문을 꺼내고 그렇게 꺼낸 것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런 질문들은 사회적 감수성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일종의 갑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례한 질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근본적으로 상처낸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미 결혼한적 없는지 그리고 동거는 한적 없는지 결국 내 딸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이를 만나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은 아니냐는 질문으로 들릴 뿐이고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이 나쁜 인간이지 않은 것을 증명하라는 폭력일 뿐이다.
[인격적인 상처에 대해서 ─ 누구의 편이 된다는 것] 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전한 적이 있다.
가볍게 한 말 무겁게 한 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까지 적어온 감수성을 적용하면 감수성이 낮은 말과 감수성이 높은 말로 대체해도 같을 것이다. 결국 감수성이란 사회가 만든 규칙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에 대한 공감을 통해 만들어진 배려가 얼마나 훈련되고 익숙해졌는가를 뜻할 것이다. 화상입은 아이에게 "너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화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니 뜨거운 것을 다룰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소아 당뇨 아이들에게 "단 것 많이 먹어서 그래?" "몸을 어떻게 관리해서 그래"라는 심판자같은 말은 차라리 하지 않고 입닥치고 있는 것이 예의일 것이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감수성을 훈련하고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이에 비추어 해야하는 말인지 아닌지 한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감수성이 가지는 가장 큰 기능일 것이다. 소위 인권 감수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조사받는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불편하게 심지어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인권 감수성이 낮은 사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이란 인간이 덜 상처받고 덜 불편할 수 있는 반대로 공권력을 가지는 조사기관은 조금 더 불편하고 까다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결혼을 증명하라는 것은 두려움에 의해 감수성이 무너진 상태라면 공권력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욕심에 의해 감수성이 무너진 상태일 것이다. 결국 감수성은 인간의 두려움과 욕심 (fear and greed) 으로 낮아질 때가 많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이 영어로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human right sensibility 라고 대답하지만 사실 인권 감수성을 human right sensibility 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sensitization of human right 혹은 아예 training 이라는 더 명확한 설명일 것이다. 즉,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란 하나의 능력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생활화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일상에서 항상 훈련해야 만들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변화한다면 당연히 그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대간의 갈등이란 변화한 세상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달라진 사회적 감수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길 것이다. 예를 들어 여자가 해야하는 가족 안에서의 역할이나 위치 등으로 많은 상처를 줄 때가 많다. 아이들의 육아는 여자의 몫이고 경제적인 활동은 남자가 해야 한다는 지난 시절의 생각들은 그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일 수 있지만 인권 감수성에 비추어 보면 개인의 행복보다는 사회안에서의 기능적 역할을 얼마나 강조해왔는지 생각하게 된다.
인권 감수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집단 혹은 타인에 대한 뒷담화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은 대놓고 상대방에게 예의없는 상황보다는 일반화해서 만드는 편견 예를 들어 '중국사람들은 원래 그래' 혹은 '그 지방 사람들은 ...' 과 같이 편견들을 많이 듣게 된다. 그리고 사람 들 앞에서는 예의를 중시하지만 뒤돌아서 상대방이 없을 때 함부로 평가하거나 뒷담화하는 사람들에게도 인권 감수성은 쉽게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은 밝은 곳에서보다 어두운 곳에서 더 잘 보이게 된다. 종종 자신의 SNS 계정에 자신의 연인 사진을 올리는 이들이 있다.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초상권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기 보다는 나와 만나는 하나의 소유물 혹은 나는 이런 사람과 만나고 있어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악세사리처럼 만들기 쉽기 때문이다. 개인을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행복은 커녕 인권조차도 쉽게 훼손할 때가 있다. 특정 사이트 안에서는 자신의 연인이 일하는 곳을 공개하고 자신과의 은밀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자랑삼아 글을 올리기도 한다. 그런 이들에게는 인권 감수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단체 대화방에서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을 자랑하고 그런 동영상을 올리는 행동은 결국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인간조차도 도구일 뿐이라는 기대하기 힘든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수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아주 간단하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평화로울지 몰라도 오만과 편견으로 사람들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 경쟁에 유리한 사회가 될 것이고 그런 사회의 목적은 아주 확실하다. 바로 생존일 뿐이다. 인간의 고통에는 관심가지지 않고 누군가의 아픔은 그냥 사실일 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잘 생존하다가 갑자기 빠진 불행 속에서는 그 누구의 공감도 없이 스스로의 고통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강한 진통제를 사용하면 통증이 없으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강한 진통제를 먹으면 날카로운 물건에 손이 상처가 깊게 나고 피가 심하게 흘러도 잘 모를 때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통증이 사라지면 좋겠다. 단 하나도 안 아픈상태였으면 좋겠고 그런 상태를 위해 참지 말고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고 하지만 통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서 어디가 불편한지 아픈지 빠르게 알아낼 수 없다. 그래서 불편하고 사라졌으면 하는 우리 몸의 반응들 중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 많다. 염증이 생기면 아프지만 염증이 생긴 부위를 통해 어디가 문제인지 빠르게 알 수 있고 염증이 만들어진 부위에 더 집중해서 더 빨리 치료할 기회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통증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타인의 고통에 사회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만과 편견에 쌓여 많은 것들이 당연한 세상에서 조금은 아닐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의 시작은 결국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세상의 고통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감지한다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단테의 신곡은 문학적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현생에서의 삶 이후 자신의 행동들에 따라서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선행을 해야한다는 교훈을 떠나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지옥 안에서 만나는 이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단테가 지옥을 들어가는 곳 앞에서 마주하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슬픔의 도시는 città dolente 으로 슬픔이란 뜻도 있지만 후회 혹은 상처만이 남은 곳이기도 하다. 영원한 고통은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고통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파멸된 인간들 속으로 란 말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이들의 세상이다. 전체적으로 지옥은 단절 그리고 무관심 무엇보다 함께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공간들이다. 아마도 감수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이처럼 관계에서 서로 상처만 남고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서로의 존재가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타인을 자신처럼 생각할 수 있는 '공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감이 필요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공감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공감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면 여러가지 예를 들 뿐 공감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적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복잡해지고 자신의 영역은 명확해지고 공감의 필요성은 강조하지만 정작 사회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남기 위해서 타인보다는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타인보다는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역시 공감이란 어느정도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고 배워야 하는 그리고 노력해야 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막상 공감과 타인을 불쌍하게 혹은 긍휼하게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은 듣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오히려 세상은 정의와 진실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타인에게 더 엄격한 진실을 요구하고 그 진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쉽게 생각한다.
감각, 공감
너무도 비슷한 말들이 혼재되어 사용되지만 조금이라도 그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본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감각이라는 말은 sense 로 사용되고 외부의 자극, 현상 등을 감지해서 알아내는 곧 깨닫는 과정이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후각,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미각의 소위 오감을 통해서 외부를 알아내고 그 감지한 (sensing) 정보를 뇌로 보내 뇌에서는 이를 처리하고 정보화하게 된다. 외부에서 전달된 신호 (signal) 를 뇌에서는 정보로 처리를 하고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한다. 모든 생명체가 감각을 가지는 일차적인 이유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빨리 알아내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차적인 이유는 과학의 목적과 동일할 것이다. 즉, 당장 위협의 요소는 아니지만 외부의 다양한 신호를 받아들이고 이를 체계화해서 일반화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연구 혹은 학문의 목적이다.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Alfred North Whitehead 가 교육의 목적에서 제시했던 낭만의 단계와 정밀화의 단계를 거쳐서 일반화의 단계를 가지게 된다. 이때 낭만의 단계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도 정밀화의 단계에서도 감각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래서 시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이들 더 구체적으로 태어나면서 아예 가져보지 못한 이들과 가지고 있다고 상실한 이들이 생각해보면 시각적인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는지 반대로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시각적 정보를 얻지 못하는지 생각할 수 있다.
마가렛 애트우드 Margaret Atwood 가 기술에 대해 했던 다음의 내용처럼
All human technologies are extensions of the human body and the human mind. 모든 인간 기술은 몸과 마음의 연장이다.
인간 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가지는 감각 그리고 그 감각을 통해서 빠르게 신호를 받아들여 정보를 만들어내고 싶은 인간의 노력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정의는 기술에 대한 성격을 더욱 정확하게 해준다. 안경이나 보청기 뿐만 아니라 현미경 망원경까지 인간이 가지는 감각을 확장해주고 일반적인 인간 능력으로는 얻어내기 힘든 영역 domains 까지도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인간 감각의 연장 혹은 확장이다. 감각은 본능에 가깝기 보다는 오히려 이성에 더 가까운 것이고 학문의 이유이기도 하다. 세상의 원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감각하려고 하는 과정은 인간의 가장 활동적인 연구 내용이기 때문이다. 감각이란 상당히 능동적인 활동이다. 외부의 자극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위협적인 신호라고 해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이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해도 무관심하다면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감각이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의 법칙같은 것이라기 보다는 세포가 에너지를 소모해서 세포 안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오는 능동수송 active transport 에 더 가깝다.
공감에 대해 이야기하면 공감을 영어로 무엇이라 표현하는지 부터 설명하는 이들이 많다. 영어로 sympathy 와 empathy 가 있고 이 둘의 차이는 sympathy 는 '동정하다/측은히 여기다' 라고 해석하고 empathy 는 '공감하다' 이고 마치 sympathy 보다는 empathy 를 가져야 하는 감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한때는 의사였다가 한때는 대선주자였던 누군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마치 사실처럼 되어버리고 마치 두가지 중 empathy 가 더 우위가 되어버렸고 하나의 편견처럼 되어버렸지만 sympathy 란 상대방의 상황 condition 이나 환경 circumstance 때문에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I am so sorry for your loss"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sympathy 의 예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공감한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때리고 나쁜 아버지였고 최근까지도 상대방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잘 안다고 해서 상대방의 속마음에 공감한다고 "이제 속시원하겠네" 라고 말한다면 괜찮을까 생각해 보자. 그래서 sympathy 를 동정하다/측은히 여기다 라고 골라 해석하지 않고 위로하다 연민을 느끼다라고 충분히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연민의 가치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해 본다. 누군가를 크게 공감하는 능력이 만드는 현상이 있다. 바로 자신을 납치한 이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비이성적인 현상을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 Stockholm syndrome 이 있다. 사회적인 법률을 떠나 자신을 납치한 이를 이해하고 크게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다면 단순히 동정과 공감으로 구별해서 empathy 의 능력을 강조한다면 스톡홀름 증후군을 가지는 인질은 공감 능력의 성자일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에서 우리가 비이성적인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사회라고 하는 공감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감수성에 대한 단상
시대 (역사) 와 사회 (문화) 를 떠나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이 있을까 생각한다. 즉, 문명이 없던 원시 인류에게 죄라는 것이 존재했을까 궁금한 것이다. 생존이 목적이였던 그 때에도 모르긴 몰라도 자신과 같이 수렵을 하는 동료를 먹으면 안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일부 생명체는 자신과 유전적으로 비슷한 개체를 잡아먹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가끔 영장류에서도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같은 개체 사이에서도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잡아먹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없다. 단순하게 유물론 관점에서 바라보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 그냥 단백질과 지방 등으로 이루어진 아주 괜찮은 영양 공급원이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 고기를 먹는 경우는 극도의 불쾌함을 가지기도 한다. 물론 공감의 능력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처음부터 인류는 식인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존재하면서 인식하고 있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된다.
문화인류학을 통해 살펴보면 식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과정이기 전에 하나의 의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이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 파푸아뉴기아의 포어족은 장례 의식 중에 죽은 가족의 시체를 먹는 식인 문화가 있었다. 그들은 죽은이의 영혼과 같은 개념을 통해서 죽었지만 시체를 나누어 먹어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은 이의 시체를 먹는 인육 섭취의 과정은 불쾌한 과정이 아닌 당연히 마무리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영양학 혹은 감염의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런 식인 풍습은 상당히 나쁜 것이다. 우선 시체에서만 발생하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될 가능성도 높고 시체의 보관 상태를 고려해도 인육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이 포어족의 식인 풍습은 새로운 발견을 하도록 했다. 쿠루병이라고 운동장애를 시작으로 전신에 걸친 신경학적 마비 증상이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데 현재는 감염성 높은 뇌조직을 섭취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감염성 높은 단백질을 프라이온 Prion 이라 부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한참 논란이 일었던 광우병 - 소해면상뇌증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과 사람에 발생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CJD) 등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인간 뿐만 아니라 동종 혹은 유전적 유사성이 높은 동물들의 영양학적 섭취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모두 영양학적으로 모두 분해되어 자신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다시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지고 그 단백질을 만들어 내는 설계도가 유전자인데 이미 만들지도 않은 재료 중 완성품이 있을 때 어떤 질환이 일어날지 예상하기 힘든 것이다.
다시 넘어와서 식인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보아도 이제는 식인이 인간이 저지르는 나쁜 짓이라고 모두 공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모든 문화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관련된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느정도의 예외는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영화 하트 오브 더 씨 In the Heart of the Sea (2015) 나 얼라이브 Alive (1993) 과 같은 예가 있다. 그리고 현재도 국제법상으로는 식인은 중죄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죄를 묻지 않기도 한다. 살인의 경우도 비슷하다. 미국과 같이 광범위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국가(주)에서는 상대방을 죽이고도 기소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기소한다고 해도 실형을 살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때로는 살인에 의한 희생자보다 정당방위에 의한 희생자가 더 숫자가 많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서 정당한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런 정당방위는 암살을 하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이야기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정당방위의 범위가 너무도 협소하여 때로는 자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 남편이 막은 강도가 죽어도 남편을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정당방위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점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문화적인 가치보다도 오히려 법률적인 적용 내용이 더욱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느정도 정당방위에 의해서 행동해도 되는지는 형법이 정하는 범위가 어느정도인지가 중요하지 의도나 과정은 참고가 될 뿐이다. 그래서 정당방위가 상당히 넓게 인정되는 미국의 경우 총기 범죄가 많은 곳에서는 총기로 오인되는 물건을 가진 것만으로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정당방위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 가지는 죄책감이나 도덕적 감정은 나중의 문제이다.
우리가 가지는 감수성을 생각하게 된다. 감수성이란 영어로 sensibility 라고 해석하지만 이 느낌은 얼마나 감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마치 볼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가의 sense + ability 가 아닌가 싶어진다. 그래서 감수성이란 마치 타고난 능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처럼 해석되기 쉽지만 식인 혹은 살인이라는 주제를 통해 살펴봐도 모든 식인이나 살인조차도 죄를 묻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오히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죄인지 아닌지보다 인간의 행동 / 말이 가지는 사회적 감수성에 비추어 어느정도 용납이 가능한지 물어야 할 때가 더 많다. 그리고 결국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묻는 주체가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가 가지는 감수성의 정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종종 감수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개인의 능력 혹은 개인이 가져야 하는 덕목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사회의 결과물인 경우가 더 많다.
사회적 감도
핸드폰을 쓰면서 감도가 떨어져 신호가 잘 잡혀 혹은 신호가 좋다 라는 표현을 할 때 기술적으로 자주 쓰는 단어가 감도 sensitivity 이다. 감도가 좋으면 외부의 작은 신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서 이를 감각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청각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외부의 소리 자극에 더 반응하기 쉽다. 반대로 그렇게 감도가 높은 이들은 그만큼 외부의 자극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그만큼 감도는 양면적인 측면이다. 감도를 높여서 감각을 하면 많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어 정보를 높일 수 있지만 쏟아지는 정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면 일상이 정보의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화재 경보기의 감도가 높아 자주 잘못된 경보를 울리게 되면 화재 경보기를 꺼놓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즉, 감도도 중요하지만 그 감각된 정보를 어떻게 잘 처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처리하는 정보처리 과정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감도 social sensitivity 를 생각해보아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다. 요즘에는 자주 거론되는 성감수성을 생각해보자. 성감수성이 낮았던 과거에는 성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할 때가 많았다. 대부분 성범죄의 피해자였던 여성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냐 혹은 합의를 보아서 다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성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조사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고문이 수사의 한 방법이라고 자랑하던 공권력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도 아니다. 아무리 강도가 높아도 성범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성감수성은 낮았을 것이고 그만큼 높은 성범죄의 피해자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커녕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가해자들이 그렇게 죄의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개인에게 돌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도가 낮기 때문에 즉, 성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꺼진 화재 경보기때문에 화재가 일어나도 대피하지 못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보는 것처럼 그 사회의 사회적 감수성이 없다면 결국 그 사회가 화재처럼 큰 충격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게 된다.
결국 사회적 감수성이 낮은 사회에서는 총체적인 문제가 터져 상당수의 피해자가 생기기 전까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리고 그런 감수성의 낮은 반응은 의외로 우리들 사이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무슨 일 있겠어?", "그게 뭐 어때서?" 혹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야?" 와 같은 반응들은 우리의 사회적 감수성을 낮추는 사회적 인식에서 나오는 표현들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새로운 감각 그리고 새로운 감수성
인간에게는 오감(五感)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오감은 가장 기본적인 것일 뿐이고 새로운 기술에 따라 새로운 감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감각이 될 수 있고 인터넷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만들어 내지 않아도 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유용할 때가 많고 잘 사용하지 않는 이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어내는 것만을 생각해도 기술을 잘 이용하는 것도 인간의 새로운 감각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치 스타트렉 디스커버리 시리즈에 나오는 사루 Saru 와 같이 칼피언족은 자신의 대량살육을 감지할 수 있는 후두부에 있던 위험감지신경 (threat ganglia) 과 같이 다양한 종족들이 기술에 따라서 새로운 감각기관을 만들어 내는 세상같다. 그래서 아직 기술이 잘 적용되지 않거나 초기 도입 상태라면 그 기술을 통해 감각할 수 있는 이들이 적고 당연하게 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각할 수 있는 감수성도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지털 저작권이나 개인정보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소위 디지털 감수성은 기술의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 없고 예전에는 대기업조차도 개인정보를 모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그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악용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래서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고 있던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면 결국 그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해서 새로운 피해자들이 생기게 된다. 그때는 그리고 여전히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감수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나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는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보아도 결국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당연하 사회적 감수성이였다. 그런 시절에는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유출시켜 팔거나 악용하는 것이 그리 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낮은 디지털 감수성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심지어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제대로 된 비밀번호 관리를 하지 않는 (2차 인증이나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보안 감수성에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범죄에 쉽게 이용될 수 있는 문을 쉽게 열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쉽게 알려준 특정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통해 남자친구는 다른 서비스의 계정에 접속하고 이메일이나 대화내용 그리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비밀번호 공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낮은 감수성과 알려준 비밀번호인데 다른 곳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낮은 감수성으로 결국 예상할 수 없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감수성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바로 인터넷이다.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목적없이 공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에서 개인정보를 두가지로 구별했다. 우선 바로 알 수 있는 개인정보인 '본연적 개인정보' material privacy 이라 설명했고 바로 개인정보를 알 수 없지만 유추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는 '가공된 개인정보' manufactured privacy 으로 구별했다.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겠지만 아파트단지 사진이나 주변의 간판 등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개인정보이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올린 아이(들) 사진을 올릴 수 있지만 나쁜 마음을 먹는 납치범의 좋은 목표물이 될 수도 있다. 메신저나 닫힌 공간에서 자신의 성범죄 등을 대화하고 공유하는 이들도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낮은 감수성이 만드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상에는 닫힌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인터넷은 더욱 그렇다. 낮은 성감수성을 가지고 인격의 수준을 의심할 수 있는 이들의 대화 내용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감수성이 그정도인데 조금 닫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감수성의 발명
사회가 가지는 감수성은 사회 안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규칙을 통해서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할 수 있다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결국 법률에 의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법률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음란물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잘 인지한다면 그런 행동은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혹은 그런 법률이 있어도 나는 피해갈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이들에게는 그런 법률은 어떠한 장벽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적 감수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가지는 감수성이 낮게 된다. 종종 볼 수 있는 기득권자들의 갑질 논란도 결국 자신이 법률적 테두리를 벗어나 즉 사회적 감수성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감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감수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률 혹은 사회가 가지는 규법과 동일하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감수성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은 결국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든다. 갑질을 해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권력이 가지는 그 불공평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갑질의 피해자는 항상 존재한다. 누군가는 힘들고 고통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법률과 규칙은 누군가 불편은 받을 수 있지만 최소한 그 피해로 고통받는 이는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감수성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자신이 만든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고통마저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런 이유로 법률과 규칙은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만들 때 불필요하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 낸다. 머리로 만든 법률은 결국 인간을 비현실적인 현실에서 살게 만든다. 그래서 법률은 오히려 인간의 고통에 관심가져야 한다.
소아 당뇨를 가진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 한국에서 소아 당뇨를 가진 아이들은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이 많다. 주사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고 급식시간은 쉽게 같이 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겉으로는 아무런 특별한 점이 없는데 소아 당뇨라는 말만 듣고는 설탕을 억지로 먹이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들의 그 잔인성은 어디에서 배운 것일까 생각하게 된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이라 생각하기에는 인간본성에 대한 배신감이 들고 주변에서 학습했다고 하면 그걸 학습하게 한 사회가 원망스럽기 때문이다. 인간본성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결국 학습한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같은 소아 당뇨 아이들이지만 미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에서 대하는 태도를 보고 나서였다. 주변 아이들도 소아 당뇨 아이들이 그저 눈이 안 좋아 안경쓰는 것처럼 음식을 조심해야 하고 필요하면 인슐린 주사도 맞아야 한다는 것이라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병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잘 인식하고 같이 어울리고 필요하다면 좀 더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한다. 같은 질환이지만 나라에 따라 인식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 인간 본연의 본성이 아닌 사회에 어떤 감수성을 제시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게 제시한 감수성은 결국 사회가 가지는 예의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예의란 결국 타인에게 함부로 상처주지 않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소아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이들은 예의없는 어른들에게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 "단거 많이 먹었지?" "도대체 몸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그런 병에 걸려?" 라는 질문을 주변에서 특히 어른들 그리고 그 어른들에서도 자신의 가족들에게서 듣는다고 한다. 예의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예의란 나이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얼마나 배웠는지의 문제이다. 그래서 단거 많이 먹어 소아 당뇨 걸린 것 아니냐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자신의 무식함으로 타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지 모르는 무지와 무례일 뿐이다. 아직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만들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은 결국 자신에 대한 질책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는 상처를 가지게 된다.
항암치료를 마치고 학교에 복학했을 때였다. 복학했기 때문에 나이 한살 어린 친구들과 공부해야 했고 모두 키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난 마지막 번호를 받았다. 키도 작은데 항암치료로 살은 찌고 머리카락은 거의 없는 소위 볼품없는 모습이였지만 내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국어 시간이였다. 선생님은 질문을 했고 내 번호에 내가 대답을 하니 질문은 멈추고 "이반은 몸무게 순으로 번호 매겼어?" 라고 뜬금없이 말했다. 반 전체는 그 농담에 모두 웃었지만 난 웃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서러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웃자고 한 농담이 나에게는 아직도 가끔 꿈에서 나타난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잊어버릴 수 있었겠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그것도 항암치료로 겨우 이겨낸 그 순간에 받아들이기에는 날카로운 상처였다. 그래서 그런지 꿈에서 악몽에 그 국어 선생님이 나올 때가 있다.
결국 인간에 대한 감수성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흑인이라 차별하거나 성소수자여서 싫다고 생각하고 말할 때 그 말이 인간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성소수자니깐 싫다는 이유로 혐오를 하고 차별을 한다면 결국 성소수자는 죽어도 된다는 끔찍한 역감수성 negative sensibility 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부터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역사와 의학으로 살펴보아도 그들의 탓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으로 차별하는 것은 예의없는 행동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감수성이란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 예의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예의를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이 규칙이고 법률이 되어야 한다.
왜 인간은 상처주는가...
인간의 상처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가 주는 상처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만든 원칙이 있다. 결정할 수 없는 내용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별하고 결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유를 대어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 앞서 말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불쾌함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으로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그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혈액형을 가지고 B형이니깐 어느 지방 출신이니깐 심지어는 남자이기 때문에 ... 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거나 그 편견으로 다음 논리를 이어갈 때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준다.
누군가 좋은 감정으로 만나려 하는데 남자 여자 나이차이가 많았다. 좋은 만남을 시작할 때 여자 부모님들은 남자를 만나서 이것저것 묻기 시작한다. 결혼 상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 궁금한 것이 많을 수 있지만 우선은 나이가 많은 것부터 신경쓰이기 시작하셨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나이 많은 것으로 이어진 걱정은 바로 '결혼한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동거한 적은 없었는지' 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을 요구했다. 물론 그러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존재했다. 나이는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나이로 인해서 결혼한 적이 없는지 묻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한적은 없는지 그리고 동거한 적은 없는지를 묻는 질문들은 무엇을 걱정하는 것인지 듣는 이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같은 질문을 누군가 자신의 딸에게 했다면 그 기분이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역지사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질문들이 상대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던진 질문인지 고민은 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은 이성적인 질문보다는 두려움에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질문을 꺼내고 그렇게 꺼낸 것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런 질문들은 사회적 감수성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내가 어떤 질문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일종의 갑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례한 질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근본적으로 상처낸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미 결혼한적 없는지 그리고 동거는 한적 없는지 결국 내 딸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이를 만나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은 아니냐는 질문으로 들릴 뿐이고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이 나쁜 인간이지 않은 것을 증명하라는 폭력일 뿐이다.
[인격적인 상처에 대해서 ─ 누구의 편이 된다는 것] 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전한 적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가볍게 할수록 상대방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무겁게 할수록 상대방의 마음을 가볍게 만든다. ─ 道馬 垣俊
가볍게 한 말 무겁게 한 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까지 적어온 감수성을 적용하면 감수성이 낮은 말과 감수성이 높은 말로 대체해도 같을 것이다. 결국 감수성이란 사회가 만든 규칙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에 대한 공감을 통해 만들어진 배려가 얼마나 훈련되고 익숙해졌는가를 뜻할 것이다. 화상입은 아이에게 "너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화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니 뜨거운 것을 다룰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소아 당뇨 아이들에게 "단 것 많이 먹어서 그래?" "몸을 어떻게 관리해서 그래"라는 심판자같은 말은 차라리 하지 않고 입닥치고 있는 것이 예의일 것이다.
인권 감수성
인간이 인간에 대한 감수성을 훈련하고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이에 비추어 해야하는 말인지 아닌지 한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감수성이 가지는 가장 큰 기능일 것이다. 소위 인권 감수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조사받는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불편하게 심지어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인권 감수성이 낮은 사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이란 인간이 덜 상처받고 덜 불편할 수 있는 반대로 공권력을 가지는 조사기관은 조금 더 불편하고 까다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결혼을 증명하라는 것은 두려움에 의해 감수성이 무너진 상태라면 공권력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욕심에 의해 감수성이 무너진 상태일 것이다. 결국 감수성은 인간의 두려움과 욕심 (fear and greed) 으로 낮아질 때가 많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이 영어로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human right sensibility 라고 대답하지만 사실 인권 감수성을 human right sensibility 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sensitization of human right 혹은 아예 training 이라는 더 명확한 설명일 것이다. 즉,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란 하나의 능력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생활화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일상에서 항상 훈련해야 만들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변화한다면 당연히 그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대간의 갈등이란 변화한 세상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달라진 사회적 감수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길 것이다. 예를 들어 여자가 해야하는 가족 안에서의 역할이나 위치 등으로 많은 상처를 줄 때가 많다. 아이들의 육아는 여자의 몫이고 경제적인 활동은 남자가 해야 한다는 지난 시절의 생각들은 그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일 수 있지만 인권 감수성에 비추어 보면 개인의 행복보다는 사회안에서의 기능적 역할을 얼마나 강조해왔는지 생각하게 된다.
인권 감수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집단 혹은 타인에 대한 뒷담화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은 대놓고 상대방에게 예의없는 상황보다는 일반화해서 만드는 편견 예를 들어 '중국사람들은 원래 그래' 혹은 '그 지방 사람들은 ...' 과 같이 편견들을 많이 듣게 된다. 그리고 사람 들 앞에서는 예의를 중시하지만 뒤돌아서 상대방이 없을 때 함부로 평가하거나 뒷담화하는 사람들에게도 인권 감수성은 쉽게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은 밝은 곳에서보다 어두운 곳에서 더 잘 보이게 된다. 종종 자신의 SNS 계정에 자신의 연인 사진을 올리는 이들이 있다.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초상권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기 보다는 나와 만나는 하나의 소유물 혹은 나는 이런 사람과 만나고 있어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악세사리처럼 만들기 쉽기 때문이다. 개인을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행복은 커녕 인권조차도 쉽게 훼손할 때가 있다. 특정 사이트 안에서는 자신의 연인이 일하는 곳을 공개하고 자신과의 은밀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자랑삼아 글을 올리기도 한다. 그런 이들에게는 인권 감수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단체 대화방에서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을 자랑하고 그런 동영상을 올리는 행동은 결국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인간조차도 도구일 뿐이라는 기대하기 힘든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수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감수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아주 간단하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평화로울지 몰라도 오만과 편견으로 사람들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 경쟁에 유리한 사회가 될 것이고 그런 사회의 목적은 아주 확실하다. 바로 생존일 뿐이다. 인간의 고통에는 관심가지지 않고 누군가의 아픔은 그냥 사실일 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잘 생존하다가 갑자기 빠진 불행 속에서는 그 누구의 공감도 없이 스스로의 고통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강한 진통제를 사용하면 통증이 없으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강한 진통제를 먹으면 날카로운 물건에 손이 상처가 깊게 나고 피가 심하게 흘러도 잘 모를 때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통증이 사라지면 좋겠다. 단 하나도 안 아픈상태였으면 좋겠고 그런 상태를 위해 참지 말고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고 하지만 통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서 어디가 불편한지 아픈지 빠르게 알아낼 수 없다. 그래서 불편하고 사라졌으면 하는 우리 몸의 반응들 중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 많다. 염증이 생기면 아프지만 염증이 생긴 부위를 통해 어디가 문제인지 빠르게 알 수 있고 염증이 만들어진 부위에 더 집중해서 더 빨리 치료할 기회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통증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타인의 고통에 사회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만과 편견에 쌓여 많은 것들이 당연한 세상에서 조금은 아닐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의 시작은 결국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세상의 고통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감지한다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단테의 신곡은 문학적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현생에서의 삶 이후 자신의 행동들에 따라서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선행을 해야한다는 교훈을 떠나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지옥 안에서 만나는 이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단테가 지옥을 들어가는 곳 앞에서 마주하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나를 통해 슬픔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나를 통해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나를 통해 파멸된 인간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 단테, 신곡 3장
Per me si va ne la città dolente,
per me si va ne l’etterno dolore,
per me si va tra la perduta gente.
─ Dante Alighieri, Divine Comedy Inferno, Canto III
THROUGH ME THE WAY TO THE CITY OF WOE,
THROUGH ME THE WAY TO ETERNAL PAIN,
THROUGH ME THE WAY AMONG THE LOST.
─ Dante Alighieri, Divine Comedy Inferno, Canto III
슬픔의 도시는 città dolente 으로 슬픔이란 뜻도 있지만 후회 혹은 상처만이 남은 곳이기도 하다. 영원한 고통은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고통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파멸된 인간들 속으로 란 말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이들의 세상이다. 전체적으로 지옥은 단절 그리고 무관심 무엇보다 함께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공간들이다. 아마도 감수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이처럼 관계에서 서로 상처만 남고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서로의 존재가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